금도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성북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금도끼 #239] 성북 예술인들의 사랑방, 승설암
-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고, 곳곳에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자리하여 여러 세대에게 사랑받는 성북동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남아 있는 동네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의 생활 터전이자 문화적·예술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으로, 현재도 그들이 거주했던 가옥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성북문화원에서 개최한 뮤지컬 〈심우〉와 예술제 〈기억할 만해〉의 주인공인 만해 한용운의 집 ‘심우장’은 지금도 북정마을 중턱에서 자리를 지키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옛 성북천변 길에는 문인이자 화가였던 근원 김용준이 살았던 ‘노시산방’과 그로부터 집을 물려받아 화가 김환기와 수필가 김향안이 거주했던 ‘수향산방’이 있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소설가 상허 이태준이 살았던 ‘수연산방’이 여전히 남아 전통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인 조지훈의 ‘방우산장’은 집터 부근에 같은 이름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그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도끼 [금도끼 #35] 김용준과 노시산방(老枾山房) [금도끼 #121] 이태준의 『장마』 와 성북동 [금도끼#164] ‘수향’, 성북에 돌아오다
이 달의 마을아카이브
이 달에 기록된 성북 마을이야기를 만나봅니다.

- 이기석
- 삼선동에 거주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29년 신간회 복대표회의에서 상무집행위원, 신간회 영덕지회 간사로 활동하였으며, 1930년에는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휘원회 경북책임자,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조직준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1934년 징역 2년을 받았다. 1939년 경성콤그룹에 참여하여, 1940년 성북동 또는 삼선동 자택에서 경성콤그룹의 기관지를 받아 읽었다. 1944년 비밀결사단체인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자, 노농군 편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대문구 돈암정 522번지(현 삼선교로6 일대로 추정)에 거주하였다.
- 이야기 더보기

- 박태원
- 소설가이다. 1926년 『조선문단』에 발표한 시 「누님」과 1930년 『신생(新生)』에 발표한 「수염」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구인회’에 참여하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 「천변풍경」(1936~1937), 「여인성장」(1941~1942) 등을 발표하였다. 근대시기 서울의 모습과 서울 사람들의 생활, 서울말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로 꼽힌다. 돈암동 487-22번지에 땅을 마련하고 직접 설계한 집을 지어 살다가 소설 『약산과 의열단』(1947)을 내고 인세 대신 성북동 230번지 집을 받아 이사하였다. 1950년 월북하였다.
- 이야기 더보기

- 김영재
- 성북동(현 동소문로 64)에서 거주한 독립운동가이다. 1931년 상해로 망명한 뒤 상해한인청년단을 조직하여 그 이사에 선임되었다. 또한 의열단에 가입하여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의열단 동지들과 함께 통합된 민족혁명당에서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5년에는 중국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 공군의 기계사 직책으로 대일전에 참가하였다. 1938년 10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창립하자 그는 제3지대장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40년에 광복군 총사령부원으로서 충칭[重慶]에서 요인 경호 및 비서직을 맡았으며, 1945년에는 미군과 합작으로 한국항공대를 창설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이야기 더보기
주제로 보는 성북
이야깃거리와 기록을 주제별로 묶어 관심 있는 주제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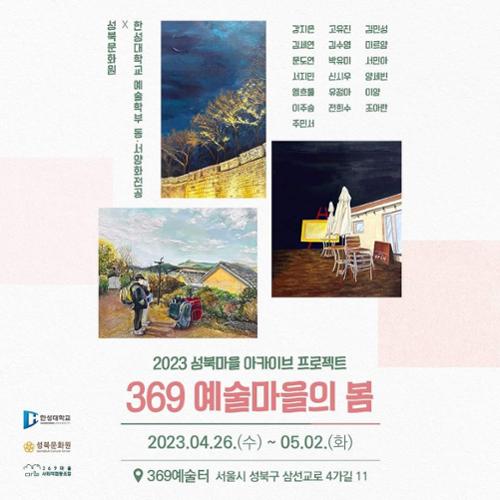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리빙랩 사업] 안암학 디지털 아카이브](/isbcc/home/u/theme/image/20.do)


![[한성대학교 아카이빙 활동] 동선2구역](/isbcc/home/u/theme/image/17.do)
![[한성대학교 아카이빙 활동] 동선·돈암동의 종교시설](/isbcc/home/u/theme/image/16.do)















